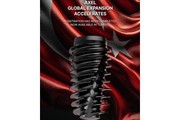전문의제도가 문제다. 새 집행부 출범 후 한 차례도 없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전공의 정원 책정을 코앞에 두고 열리기는 하였으나 지금의 운영위는 수련기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우선 운영위의 구성부터 그렇다. 협회 관계자를 제외하면 수련기관과 학계대표가 7명인데 반해 개원의는 고작 2명이다.
치과대학병원 관계자가 6명이므로 사실 대학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라 하여도 억지가 아닐 정도다. 2012년 전국의 수련기관 51곳이 신청한 레지던트 수는 402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원이 확정된 이후 이들이 수련을 받으면 평균 94%가 전문의로 ‘합격’하게 된다. 졸업생의 8%, ‘소수정예’라는 당초의 합의사항은 이제 누구의 기억에도 없다.
도대체 전문의 제도는 왜,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단 말인가? 도대체 수련기관들이 그렇게 전공의 숫자에 목을 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전공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51개의 수련기관은 후배 치과의사들을 몇 년씩 수련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에 고용하면서, 정말로 전공과목을 세부적으로 잘 수련시켜 전문의로서 손색이 없는 치과의사로 길러내고 있는가?
미국의 수련병원은 한국처럼 전속지도전문의(교수)와 전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의들도 고용되어 진료하기도 하고, 계약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진료하기도 한다. 그들은 한국처럼 교수 자리를 바라보고 헐값에 일하는 펠로가 아니라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 고용의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적자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들 한다. 의과에서 병원 경영의 손실분을 의사의 인건비에서, 특히 전공의와 펠로의 저임금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치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하나라도 더 스펙을 쌓고 싶어 하는 어린 치과의사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수련의라고 뽑아놓고 치과위생사보다 못한 허드렛일이나 시켜서야 수련병원이라 할 수 있는가!
전속지도의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 병원이 전공의 배정을 신청하여서야 되겠는가! 보철과나 교정과 전공의로 뽑아 놓고 Super GP가 되라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전공의들도 수련을 마치면 대부분 개업을 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수련한 많은 전문기술은 일반 개원의에게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는 그들이 공부하고 수련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을 외면한다면 국민과의 오해의 폭은 커질 것이고, 기존 회원과의 갈등도 깊어질 것이다.
수련기관은 동떨어진 기관이 아니라 치과계의 한 부분이다.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존의 치과의사와 치과계 전체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