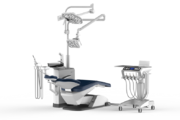미국 오렌지 주스의 대명사인 139년 전통의 델몬트 푸드가 파산했다. 코로나19 때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품 생산 설비를 대폭 늘렸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소비자들 성향이 건강식으로 전환되면서 통조림 식품을 기피한 탓도 있다. 지금은 100년 넘는 전통 기업도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면 망하는 시대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의 잠재 GDP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 지 오래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서 노동·자본·생산성을 최적으로 활용할 때 가능한 수치다. 잠재성장률이 평균물가상승률 3%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의미다. 최근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했다. 정부가 소비지원금을 풀어야 할 정도로 실물경기는 나빠졌다. 생산이나 투자로 가야 할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가 신생아대출, 디딤돌대출 등으로 부동산을 비정상적으로 밀어주며 20·30대들을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에 참가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면 전세는 결코 오르지 못했다.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가 90.7%로 세계 4위로 보고되었다. 2008년 리먼 사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이 98%였다. 미국 국력과 기축통화국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90%를 넘는다는 것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봐도 심각하다.
무섭게 올라간 부동산은 누가 보아도 집단 광기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한국의 민간 부채(가계와 비금융 기업)가 2023년 기준으로 GDP대비 207%로 일본에서 거품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 208%와 유사한 수준이고, 민간부채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일본 버블 직전 32%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은 한국이 일본 버블경제 때의 3배에 달하며, 민간부채 절반 정도가 가계부채고, 생산성이 낮은 건설·부동산 업종으로 쏠림이 심해 부채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평가했다. 만약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순간이 온다면,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최근 60·70대는 집을 팔았고 30·40대가 집을 샀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영끌로 집을 산 30·40대는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경제 주체인 세대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미국과 버금갈 정도로 풍요로울 것으로 예측되었던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으로 무너졌었다. 모든 실물경기가 나쁜데 부동산만 오른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많은 이들이 우려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정책대출로 유지했다.
이제야 새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시켰다. 금지시켰다기보다는 GDP대비 가계대출 90%인 상황에서 더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 등잔불을 끄는 방법은 두 가지다. 바람과 기름을 빼는 방법이다. 바람은 불을 끌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더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듯이 부채 문제는 결국 빚을 끊으면 해결된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도 끊어야 해결된다. 그러나 금단 현상의 고통은 처절하게 감당해야 한다. 이제 가계대출은 더이상 불가한 단계에 이르렀다. 빚의 고리가 끊어지면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거품은 자연히 그러나 급격히 무너질 것이다. 물건값은 구매자가 없어지면 서로 먼저 팔기 위해 투매가 발생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법칙이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순간, 영끌한 30·40세대가 어떻게 무엇으로 버틸 것인지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사실 부동산 버블은 터지는 것이 아니라 광기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영끌한 이들이 아주 혹독한 빚의 대가를 치를 것이 안타깝다. 너무 늦은 것이 안타깝다. 지금은 139년이 넘은 델몬트 회사도 한순간에 파산하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