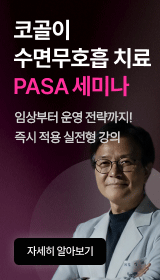한 공무원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SNS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금메달을 땄다고 국위가 선양되는 시대가 지났고, 공무원은 30년 일해야 130만원을 받는다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올림픽 금메달의 처음 시작은 필자가 중2였던 1976년이었다. 당시 올림픽 경기는 늘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선진국들의 잔치로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부럽게 바라만 보는 축제였다. 그 해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한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고, 한국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은 후진국으로 국가 이름을 아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때였다. 이제 48년이 지난 2024년에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런 시점에서 금메달리스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후진국의 설움과 아픔을 완전히 잊었다는 사실이다.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던 후진국 시절의 설움을 잊은 것이다.
후진국 선수가 선진국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강이 있다. 편파 판정의 강이다. 며칠 전 54㎏급 여자복싱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임애지 선수가 동메달을 확정했고, 이후 치른 4강전에서 튀르키예의 아크바스 선수에게 2대3으로(29-28, 30-27, 28-29, 30-27, 28-29) 판정패했다. 판정을 보면서 편파 판정의 강은 복싱에서 아직도 도도하게 흐르는 것을 보았다. 임 선수는 매 라운드 파이팅이 넘쳤고, 유효타도 많아서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오랜만에 다시 경험한 편파 판정이어서 조금은 낯설었다. 과거 후진국에게 편파 판정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편파 판정은 부패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한국도 부패지수가 높아서 90년대 후반까지는 국립대학 교수 공채에서 주임교수가 대놓고 자신이 뽑을 사람이 있으니 원서도 내지 말라고 말하던 시절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인도 양궁 한국인 감독이 멤버티켓을 받지 못한 것도 부정부패의 강을 건너지 못한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의 증거다.
아직도 어디에서나 약자에게는 불공정과 편파 판정은 존재한다. 국가 간에는 더욱 심하다. 금메달이 국위 선양을 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마도 불공정과 편파 판정의 설움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유학하던 95년도에 지도상에서 한국이 필리핀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는 외국인이 더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100번째 금메달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였는지 모를 것이다. 그런 수많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한국의 위상이 만들어졌음을 모른다. 지금 풍요를 누리는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하였다고,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후진국·개발도상국 시절의 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들이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물론 금메달 하나가 선진국이나 강대국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 금메달이 하나도 없는 날이 온다면, 올림픽은 다른 나라 축제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90년대 이전처럼 주변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을지 의문이다. 어린 자녀가 “왜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나요?”라고 질문을 하면 그땐 무어라 답변할 것인가. 과연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가지고 금메달이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니 상관없다고 말할 것인가. 후진국과 개도국의 설움과 부정부패로 인한 좌절감을 맛보지 않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할 것인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다. 카이스트 학생회장과 SKY 학생이 포함된 전국 규모의 마약동아리가 적발되었다.
역사는 잊는 순간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젊은 세대가 할머니·할아버지 그리고 부모 세대의 아픔과 설움과 인내를 기억하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금메달이 하나도 없는 국가의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