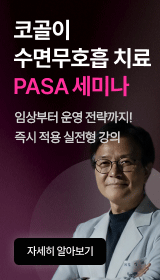하루는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궁금해서, 필자의 수술 케이스를 텍스트 서너줄 정도로 간략히 요약해 ‘GEMINI’에 넣어봤다. 그랬더니 마치 임상사진이라도 본 것처럼 그 시도가 갖는 의의와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내고 한계점까지 정리해줬다. 보통 수술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로 설명할 경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뭐라도 추임새를 그럴듯하게 주워 담으려면 본과 4학년을 넘어서 최소 인턴이나 수련의는 돼야 기대할 수 있는 레벨이다.
하루는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궁금해서, 필자의 수술 케이스를 텍스트 서너줄 정도로 간략히 요약해 ‘GEMINI’에 넣어봤다. 그랬더니 마치 임상사진이라도 본 것처럼 그 시도가 갖는 의의와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내고 한계점까지 정리해줬다. 보통 수술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로 설명할 경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뭐라도 추임새를 그럴듯하게 주워 담으려면 본과 4학년을 넘어서 최소 인턴이나 수련의는 돼야 기대할 수 있는 레벨이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ChatGPT나 GEMINI 외에도, 논문들을 검색해 컨센서스를 정리해주는 것에 특화된 AI서비스도 있다. 문장으로 명제를 입력하면, 몇 분 만에 관련 논문 수백 개, 수천 개를 검색해서 과학적인 뒷받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준다. 논문을 꼼꼼하게 읽을 때의 장점들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 하겠지만, 누군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 더 이상 갸우뚱하고 헷갈려 할 이유는 없어졌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환자가 내원했다.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취미로 하는데, 다이빙 도중 오른쪽 위 치아 부위에서 치통이 생긴다는 주소로 내원한 환자였다. 중절치부터 제2소구치까지는 크랙도 거의 보이지 않는 멀쩡한 상태였고, 16번 치아에 마진이 들뜨고 변색된 오래된 레진이 보였다. CT를 보니 우측 maxillary ostium이 막혀있고 비염이 관찰된다. 다이빙 시에만 아프고 일상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했다.
치과를 하면서 프리다이빙 시의 치통으로 환자가 내원할 일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 일단 필자는 18년 임상경력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는 진단은 감이 무뎌지기 마련이다. 기억의 한켠에 압력과 치통에 관한 내용이 순간 떠오르기는 한다. 다만 항공과 관련한 기압변화와 치통의 상관관계가 익숙하지, 심해는 영 낯설다. 일단 몇 가지 물어본다. 어느 정도 수심까지 다이빙하는지 물어보니 15~20미터 잠수를 한다고 한다. ‘아,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네.’ 대화를 통해 제법 고수이고 열심히, 자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스케일링을 먼저 시키고 원장실로 들어와 AI로 검색을 해봤다.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내용을 찾아서 정리할 때, AI가 유용하다. 관련 연구들을 정리해주고, 유병률과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 잠수 깊이를 물어보기 잘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의 재확인에 가까우나 벼락치기 하듯 족집게로 리마인드 해주는 효과도 무시 못 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다이빙의 하강 시에 아픈 건지, 상승 시에 아픈 건지에 따라 의심할 것이 달라진다는 건 AI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환자는 하강 시에 통증이 있다고 뚜렷하게 구분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심미학회에서 Galip Gurel, Stefen Koubi의 4시간짜리 메인 강연이 있었다. 디지털 목업과 플래닝, 디지털 제작 프로세스를 3시간 넘게 이야기한 다음, 로봇으로 프렙한 케이스를 공개한 것이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오, ‘피지컬 AI’인가! 인도에서 서른다섯 케이스를 해봤다고 하는데, 실제 오차가 100~15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한다. 구강스캐너 역할의 센서가 달려있고 여차하면 즉각 멈추는 안전장치도 삼중, 사중으로 돼 있다고 한다. 반쯤은 의심하며 보기는 하는데, 몇 년 뒤에는 현실화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 로봇 덕후같은 공대생 인도 청년 두세 명이 내놨다면 신경도 안 썼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인물들이 저명한 심미치료 연자들이라는 점이 위기감을 더한다. 과거에는 라미네이트 등의 심미치료, 기공과정 등을 체계화, 단순화, 규격화하며 대중화를 이끌었던 이 리딩 그룹의 다음 목표가 영원히 치과의사의 영역일 거라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치아 프렙에 도달한 것이다. 과연 프렙에서의 휴먼 에러와 로봇의 공차가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치과에 AI가 왔다. 그렇다. 이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