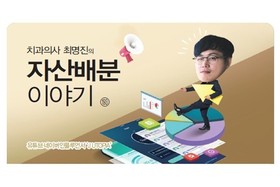1945년 9월 2일 일본 도쿄만 해상의 미국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알리는 일본의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하나인 그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이 사용한 만년필은 오렌지색 ‘파커 듀오폴드’였다. 이날 함상의 녹색 테이블 위에서는 역사적인 만년필의 향연이 펼쳐진다. 먼저 일본 측 시게미쓰 마모루 외상과 우메즈 요시지로 사령관이 서명에 나섰다.
1945년 9월 2일 일본 도쿄만 해상의 미국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알리는 일본의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하나인 그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이 사용한 만년필은 오렌지색 ‘파커 듀오폴드’였다. 이날 함상의 녹색 테이블 위에서는 역사적인 만년필의 향연이 펼쳐진다. 먼저 일본 측 시게미쓰 마모루 외상과 우메즈 요시지로 사령관이 서명에 나섰다.
두 사람은 데스크 펜을 외면하고 만년필로 서명했다. 이어서 연합군 대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테이블 앞이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한 움큼 꺼내더니 두 권의 항복 문서에 사인해 나갔다. 처음 사용한 두 자루는 뒤에 서 있던 미군과 영국군 장교에게 건넸다. 이어 두 개의 펜으로 추가 서명한 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듀오폴드 오렌지 만년필을 집어 들었다. 아내인 작가 진 맥아더가 20년 동안 사용한 펜을 빌려와 서명식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다.
1945년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이 나치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협정에 사용한 만년필도 ‘파카 51’이었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날, 서독의 콜 총리와 동독의 디메제이로 총리가 서명한 통일조약에서는 ‘몽블랑’ 만년필이 사용되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사실상 냉전을 종식할 때 사용된 만년필도 파커였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만년필은 그 존재 자체가 역사다.
20세기 들어 국가 간의 조약 체결 서명 등 역사적 현장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만년필로,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에는 만년필이 함께했다. 조약이나 협정체결 등에서 각국 수뇌들이 쓰는 만년필은 그 나라를 상징한다. 그들의 철학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경제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 간 중요 행사에 서명된 만년필 브랜드는 그 자체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품는다. 1997년 임창렬 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때 몽블랑으로 서명했다가 구설에 오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2016년 콜롬비아 내전 종식 서명식에서는 총알과 탄피를 녹여 만든 펜이 쓰인 것처럼 지금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각종 법안이나 서류에 서명한 후 관련인에게 펜을 선물하는 게 관례다. 전통적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크로스 브랜드 펜에 본인 서명을 각인해 사용하고 기념품으로 선물하는 것이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문에 흔하디흔한 마커펜으로 서명한 뒤 이를 건넨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문서인 만큼 만년필을 사용하고 선물했을 것이란 관측은 여지없이 깨졌다. 청와대는 선물 받은 펜이 사인펜이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대로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크로스 펜으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참석자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대로 크로스 펜을 선택했고 백악관 납품이 이루어졌었다. 이 펜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에도 사용됐다. 당시 미국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 펜을 쓰도록 준비했지만 김 위원장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건네준 ‘몽블랑’ 만년필로 서명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대로 만년필로 서명하지 않는다. 곁에는 여전히 마커펜이 있다. 각종 서명은 물론 기자회견 원고에서도 마커펜을 사용해 손 글씨를 써 놓은 내용이 많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대통령이 관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본인의 기호 문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지난해 제73차 총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개별 감사보고서 채택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감사보고서가 찬반 투표로써 채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대의원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해 온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개별 감사의견서 채택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관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