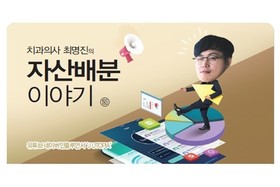‘딜 레마’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di(두번)와 lemma(제안·명제)의 합성어로서 두 가지의 명제 사이에서 한쪽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더불어 ‘산미치광이’란 고슴도치처럼 몸과 꼬리가 가시 털로 뒤덮인 동물로 ‘호저’라고도 한다.
그런데 심리학에는 ‘산미치광이의 딜레마’ 혹은 ‘멧돼지의 딜레마’라는 표현이 있다. 미국의 정신과의사인 벨락이 쇼펜하우어의 멧돼지 우화를 인용하여 인간의 갈등관계를 해석했다. 우화의 내용은 멧돼지 두 마리가 있었다. 날씨가 유난히 추운 겨울날 밤이 되자,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몸을 기대려 하였는데, 너무 가깝게 가면 자신들의 피부에 돋아있는 가시와 같은 털이 서로에게 상처를 냈다. 그래서 떨어지면 추워지므로 멧돼지들은 서로의 몸에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를 찾아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며 적절한 거리를 찾는다는 이야기이다. 남녀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설명하면 쉽게 이해되기도 한다. 가까이 가는 것을 ‘사랑’이라 하면 떨어지는 건 ‘미움’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랑과 증오의 감정은 늘 공존한다는 숙명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붙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인간관계를 일컬을 때를 말하기도 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문제이기도 하다. 떨어져 있자니 외롭고, 너무 가까이 가면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구속당하거나 자유롭지 않아질 것 같은 모순 말이다. 이것이 쇼펜아우어나 벨락이 말하고 싶었던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가가는 것과 상대가 상처 받지 않도록 나의 가시를 없애는 방법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자식이 어릴 때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는 힘에 있어서의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아이들의 성격, 인격 형성에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 또한 비슷하다. 환자와 너무 가까워지면 치료에 있어서 플라시보효과가 줄어든다. 또 너무 멀어지면 의사를 불신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한다. 이것의 극단적인 상황이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너무 가까워졌을 때가 최근 발생한 강남산부인과의 마취제 투여 환자 사망사건이고, 너무 멀어졌을 때가 작년에 발생한 환자의 불만에 의한 치과의사 살인사건이라 볼 수 있다.
‘산미치광이의 딜레마’에서 말하는 적절한 거리, 적당한 거리감이란 쉽지 않은 명제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과 같이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기엔 아까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인간의 욕심을 저울질당하기 때문에 어렵고 놓지 못하기에 힘들다. 이는 동양사상의 ‘중도’와는 다르다. 중도사상은 극단적인 치우침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중도이다. 그리고 이것을 놓는 것이 중도이다. 반면 적당한 거리의 유지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외로움을 동반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가 외로움이다. 사람이 없어도 외롭고 있어도 외롭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스먼은 이미 1950년대에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위치를 ‘고독한 군중’이란 책에서 ‘군중속의 고독’이라 하였다. 결국 ‘산미치광이의 딜레마’가 인간관계의 외로움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오늘도 이런 거리를 유지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필자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노자를 따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처럼 쉬우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