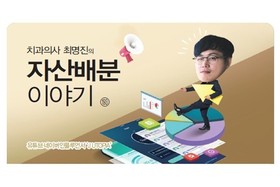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3일,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치과뿐만 아니라 의료 전반의 영역을 아울러 다루고 있다. 환자를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3일,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치과뿐만 아니라 의료 전반의 영역을 아울러 다루고 있다. 환자를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치료비 공개와 비교로 인한 가격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이 자료가 공개된 후 “같은 치료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등 한심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보면 여전히 그 우려는 남아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받아왔다. 적어도 선택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부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이미 2년째 시행 중인 제도를 없애려면 분명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 명분을 만들기는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미 시작되어버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이 자료는 자율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이다 보니,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신뢰도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로우 데이터에 가까운 만큼 추세를 가늠하는 정도의 의미는 충분히 있겠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보면 제출 자료건수는 2만9,427건이다. 그러나 한 의원에서 PFM보철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등 세부 항목을 나눠 여러 건을 제출하면 중복 집계되므로, 실제 의원 수와는 오차가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임플란트 최저가 200만원 이상으로 검색된 결과가 대략 471개(1.6%)에 해당한다. 최저가 150만원 이상이 3,771개(12.8%)에 해당한다.
임플란트 수가가 ‘망했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150만원 이상 받는 치과가 수천개가 된다. 신세계 강남점은 매일 미어터진다는데, 정말 고급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다.
필자가 예비 개원의라면, 이들의 개원 형태·지역·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덤핑치과에서 일하며, 덤핑 노하우만 배우고 나와서 덤핑치과를 차리게 된다. 하지만 고급치과를 지향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달라진다. 한 번뿐인 인생, 덤핑하며 살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젊음이 있는데 상위 10%를 목표로 하는 게 그리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닌데 말이지.
사실 평균가격을 받는 치과라면 다른 고민을 할 시점이다. 이번에 임플란트의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의 경우 24년 116만1,000원에서 25년 114만원으로 1.8% 하락하였다. 의료계를 포함한 이 데이터에서, 지난해와 올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571개 항목 중 367개(64.3%)의 평균가격이 인상되었다. 물가상승률 2.2%를 감안하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오른 항목은 142개(24.9%)였다고 한다.
임플란트는 그 와중에 오히려 1.8% 하락한 것이다. 개원한 치과의사 중 다수가 덤핑 임플란트에 위축돼 있다. 정당한 치료비를 못 받기 때문에 임플란트 공부나 관심을 접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다. 우리의 화두는 매년 최소 물가상승률만큼만은 임플란트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다.
임플란트 수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아직도 2014년 보험임플란트 도입 당시 금액인 120만원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도 임플란트 120만원은 받는다고 안심하고 있다. 그건 아니다. 올해 보험임플란트 수가는 130만원이 넘었다. 정말 중간은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보험수가만큼은 받아야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올려야 한다. 내년, 내후년을 생각하면 목표는 최소 135만원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액수 그 자체보다도, 매년 꾸준히 수가를 올리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 임플란트 수가를 아예 대국민 홍보로 알리는 것은 어떨까. 지하철에서 흔히 보이는 ‘44, 55’ 같은 임의의 가격 대신, 정부 공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임플란트는 120만원이 아니다. 130만원이다. 곧 135만원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