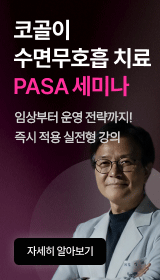아침에 눈뜨고 일어나 열어보는 스마트폰의 창에 빗물이 들이치는 모습을 보고 거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다. 요즘은 눈비 오는 것마저 스마트폰을 보고 먼저 아는 것에, 어떤 정서를 빼앗긴듯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운전하며 출근하는 길에 비에 젖은 한강변의 고즈넉하고 차분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문득 할리우드의 명화 ‘애수(哀愁)’에서, 비오는 날 런던의 워털루 다리에서 미남 장교 ‘로버트 테일러’와 발레리나 ‘비비안 리’가 처음 만나던 장면과 Auld Lang Syne 음악이 흐르던 클럽에서의 이별 장면, 그리고 비를 맞으며 서로를 애타게 찾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서적으로 아주 메마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혼자 빙그레 웃어보았다. 요즘 들어 필자가 감성적이란 유일한 증거인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 외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감동받을 만한 일들이 많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비오는 날이면 병원도 덜 북적거려 한결 여유가 생긴다. 전부터 의료계에서 농담처럼 들어왔던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말이다. ‘비오는 날에는 환자가 없다’라는 말은 선배님들의 해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하다.
역시나 오늘은 여유롭게 커피 향을 느끼며 글을 쓴다. 글을 쓰면서도 장사익의 ‘봄비’라는 노래가 귓가를 봄비처럼 촉촉이 적시며 들려오는 듯하다.
봄비는 가을비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 가을비가 쓸쓸한 코트 깃을 연상시킨다면 봄비에는 희망이 담겨있다. 어린 시절 추위 속에 뛰어놀다가 잠시 추위를 녹이려 따뜻한 햇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쬐던 그런 따스함 말이다. 비록 지금도 바람은 쌀쌀하지만 혹독한 냉기의 독기를 품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봄비는 편안한 느낌이 든다.
이런 날이면 군고구마 까먹으며 따끈한 이불 속 아랫목에서 만화 보던 그런 편안함이 그리워진다. 그런데 이젠 이런 정서를 다시 느끼기가 쉽지 않다. 침대를 사용하니 아랫목이 없어졌고, 책을 빌려 볼 만화방도 인터넷에 자리를 빼앗겨서 컴퓨터로 봐야 한다. 이젠 그마저도 스마트폰에 빼앗겼다. 이런 것들이 못내 아쉬워만 진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요즘 아이들에게는 전혀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느낄 수는 없다. 어려서의 이런 정서가 없는 아이들이기에 나이 들면서 느껴야 할 공허감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이 외로움에서 우울증으로 진화하여 극단적으로는 자살로까지 연결되는 불행을 겪기도 할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그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자살이 증가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이런 환경 속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가 우리들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자랑스러운 치과의사 아빠보다 무슨 수를 쓰든 돈만 잘 버는 치과의사가 되고자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안타깝다.
기계 문명이 생활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나의 일정을 관리하는 것부터 친구의 연락처까지 모두 스마트폰이 관리하니 언제부터인가 전화번호 하나 제대로 외우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의 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다. 이런 기계 속 삶에서 조금 벗어나 봄비 내리는 오늘은 일찍 집으로 퇴근하고 싶어진다.
고등학교 시절 무슨 뜻인지도 모르며 배운 이수복의 시 ‘봄비’가 지금 이 순간 왜 이리 구구절절한지…
“이 비 그치면 /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 푸르른 보리밭길 / 맑은 하늘에 /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 이 비 그치면 / 시새워 벙글어질 고운 꽃밭 속 /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 향연(香煙)과 같이 / 땅에선 또 아지랭이 타오르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