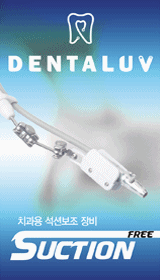요즘 세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집필하신 스님이 좋은 집에서 사는 모습으로 방송에 나가고부터 ‘무소유’를 쓰신 법정스님과 비교되어 ‘풀소유’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선승이셨던 숭산스님의 외국인 제자인 스님이 비난을 하다가 전화통화 후에 다시 칭찬을 하며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불교적 개념에서 보면 두 사건은 하나도 논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이다. 우선 ‘풀소유’의 반대가 ‘무소유’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소유(無所有)’를 한자로 해석하여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다. 불교에서 무소유란 수행 단계 중 하나이다. 수행 단계가 9가지가 있으며, 그중 8번째 단계를 ‘무소유처’라고 부르며 ‘무한의식을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경지’라고 한다. 법정스님이 책 제목을 여기서 따오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으로 소유하지 않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인 듯하다.
불교의 기본개념은 ‘중도’로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이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도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선은 당연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선하면 악을 이해하고 비로소 ‘중도’에 들어갈 수 있다. 선도 방편일 뿐 목표가 아니다. 즉 무소유는 방편일 뿐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풀소유를 하든 무소유를 하든 불교 개념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영원히 소유라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소유라는 욕망을 벗어나고 무소유라는 생각에서조차 자유로워져야 한다.
청정한 연꽃은 진흙탕에서 핀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모든 불상이 항상 연꽃좌 위에 앉아 있는 것도 욕망의 진흙탕을 넘어 연꽃을 피워 부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아직 진흙탕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한 이들이라 ‘중생’이라 부른다. 풀소유를 하든 무소유를 하든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단지 아직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중생’일 뿐이다.
불교를 자비(慈悲)라 말한다. 자(慈)란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비(悲)는 상대가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한 사람에서 많은 사람으로 넓혀가는 것이 수행이다. 다음으로 희사(喜捨)가 있다. 희(喜)란 남의 기쁨을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이고, 사(捨)는 대통령이든 거지든 악인이든 모두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다. 풀소유든 무소유든, 풀소유라 그를 비난하든, 비난하는 그를 책망하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이 불교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아함경에서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왜 수행은 강조하면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이에 부처는 “지금부터 하루 동안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여 나를 강 건너에 보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보다 나의 발로 걸어가면 간단하고 확실하게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기도보다 현실적 수행을 강조한 석가모니에게 선이란 악의 반대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덕목일 뿐이다.
불교 개념에는 비난이란 불가능하다. 비난 자체가 분별하는 상대세계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악을 넘어선, 집착을 넘어선, 옳고 그름이란 분별을 넘어선 개념이기 때문이다.
불교 개념에 의하면 ‘너는 나쁘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너는 나쁘다’가 아니라 ‘너는 아직도 욕망의 세계에 사는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이구나’이다. 혹세무민한 진흙탕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연꽃을 피우는 것이다. 수행을 통해 욕망은 끊는 것이 아니고 끊을 욕망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소유하지 말라가 아니고 소유란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을 거쳐 들어오면서 도교가 섞이었고 토착사상이 추가되며 여러 개념이 혼재되었다. 무소유도 마찬가지다. 수행의 높은 단계가 그저 단순한 소유하지 않는 개념 정도로 인식되어졌다.
승복을 입고 세속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아마도 그들에게 좀 더 높은 경지의 청빈한 삶을 기대했던 실망이 아니었나 싶다. 타인보다 내 마음의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